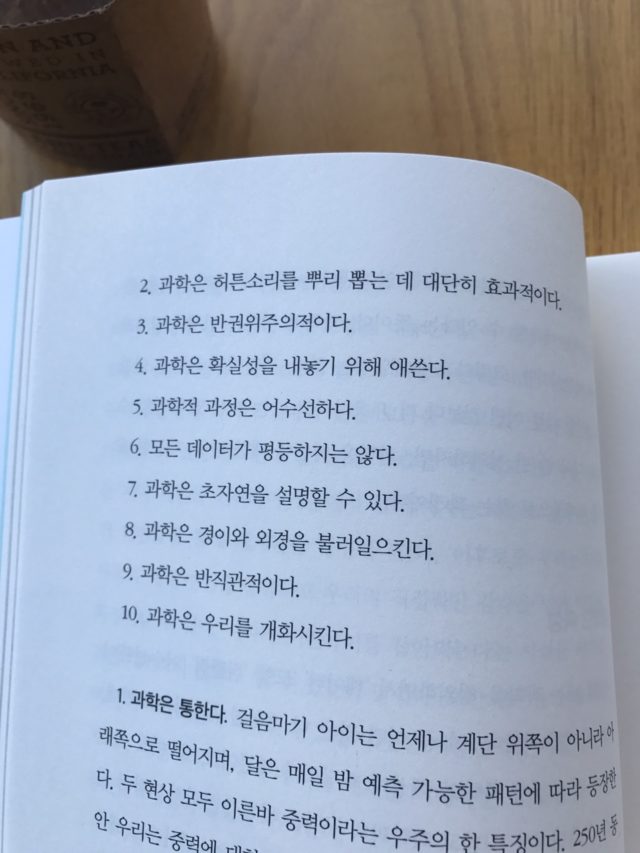처음 이 책의 제목과 표지에서 받은 느낌은 과학적 상식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읽어보니 생각보다 내용에 무게가 있다. 잘못된 사례를 과학적으로 반박해야 하기에 수학 계산도 자주 등장한다.
계산과 관련된 예로 매년 미국에 수입되는 음식물이 300억톤이라는 신문 기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일 270kg을 섭취해야 가능한 양으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알게된 정보에 대해서 타당한지 의심하고 검증해보는 것은 귀찮은 행위이지만 정보의 과잉인 시대에서 옳고 그른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책에서 과학은 아래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 과학은 통한다.
- 과학은 허튼소리를 뿌리 뽑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 과학은 반권위주의적이다.
- 과학은 확실성을 내놓기 위해 애쓴다.
- 과학적 과정은 어수선하다.
- 모든 데이터가 평등하지는 않다.
- 과학은 초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
- 과학은 경이와 외경을 불러일으킨다.
- 과학은 반직관적이다.
- 과학은 우리를 개화시킨다.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선 과학이란 무엇인지 이해하여야 한다. 책에서 과학은 절대적 진리를 찾는게 아닌 자연의 반증 가능한 모형을 찾는 것이라 말하며 ‘창조론’이나 ‘5초 전 주의자’ 같은건 어느 누구도 틀렸음을 증명할 수 없는 속성상 반증 가능한 모형이 아니며 따라서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한다.
백신의 위험성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단순한 데이터만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데이터와 복합적인 상황들을 모두 풀어 놓고 문제를 논의 한다.
특히 우리는 쉽게 잘못된 상관관계에 빠질 수 있는데 예로 사망자가 많은 지역의 공기가 나쁘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사망자가 많은 곳의 화장터가 그 지역의 공기를 나쁘게 한 것이었다.
잘못된 상관관계는 “치즈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이불에 목이 감겨 죽는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시대의 이슈와 사회적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책의 과학적 풀이에 흥미를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